컴퓨터공학자로서 AI 시대를 살아남기
스스로를 대체할 무기를 만든 자들
컴퓨터공학은 스스로를 죽일 무기를 만들어냈다.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수년 내로 AI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식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특히, 코딩이라는 행위 자체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떻게 해야 AI가 나를 대체하지 못할 것인가?”
실리콘밸리가 보여주는 ‘초격차’의 시대
아직 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내가 이 애플 스타일의 블로그를 만드는데 과연 몇 일이 걸렸을까? 단 하루다.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아닌 시스템 연구자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어중간한 개발자 여러 명을 고용하느니, 뛰어난 엔지니어 한 명에게 최고 수준의 AI 도구를 쥐여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당연한 흐름이다. 최근 메타(Meta)가 수천억을 들여 톱클래스 한 명를 영입했다는 뉴스는 바로 이 현상의 증거다. 잡다한 100명이 아닌, 압도적인 1명에게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초격차’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이 흐름은 돈이 걸린 문제이기에,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 어떤 SW 기업도 거스를 수 없다.
대체 불가능한 ‘탑 티어’ 전문가가 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해답은 AI의 본질적인 한계에 있다. AI는 결국 정교한 확률 모델일 뿐, 두 가지 명확한 약점을 가진다.
- 입력의 종속성 (Dependency on Inp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 출력의 불확실성 (Uncertainty of Output): 그럴듯한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한다.
이 두 가지 약점을 해결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즉, AI를 압도하는 두 종류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 질문하는 능력: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정의(Define)하고 질문(Prompt)할 수 있는 능력.
- 검증하는 능력: AI가 내놓은 수많은 결과물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Verify)하고, 틀렸을 경우 더 나은 질문으로 개선(Refine)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두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은, 결국 그 분야의 ‘탑 티어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어중간한 지식으로는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도, 그 답을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격(格)’은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가
“AI가 어차피 똑똑하니, 전문가든 아니든 결과는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반대다. AI는 지능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킨다. 뛰어난 전문가는 AI를 통해 더 압도적이 되고, 비전문가는 약간 더 나아지는 수준에 그친다.
탑 티어 연구자인 교수님과 주니어 티연구자인 나를 비교해보자. 같은 AI 도구가 내 손에 쥐어져도, 교수님의 연구 능력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나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답을 검증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LM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를 개발할 때, 나는 ‘LLM을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플랜을 고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갇혀 있었다. 실제로도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니까. 내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멈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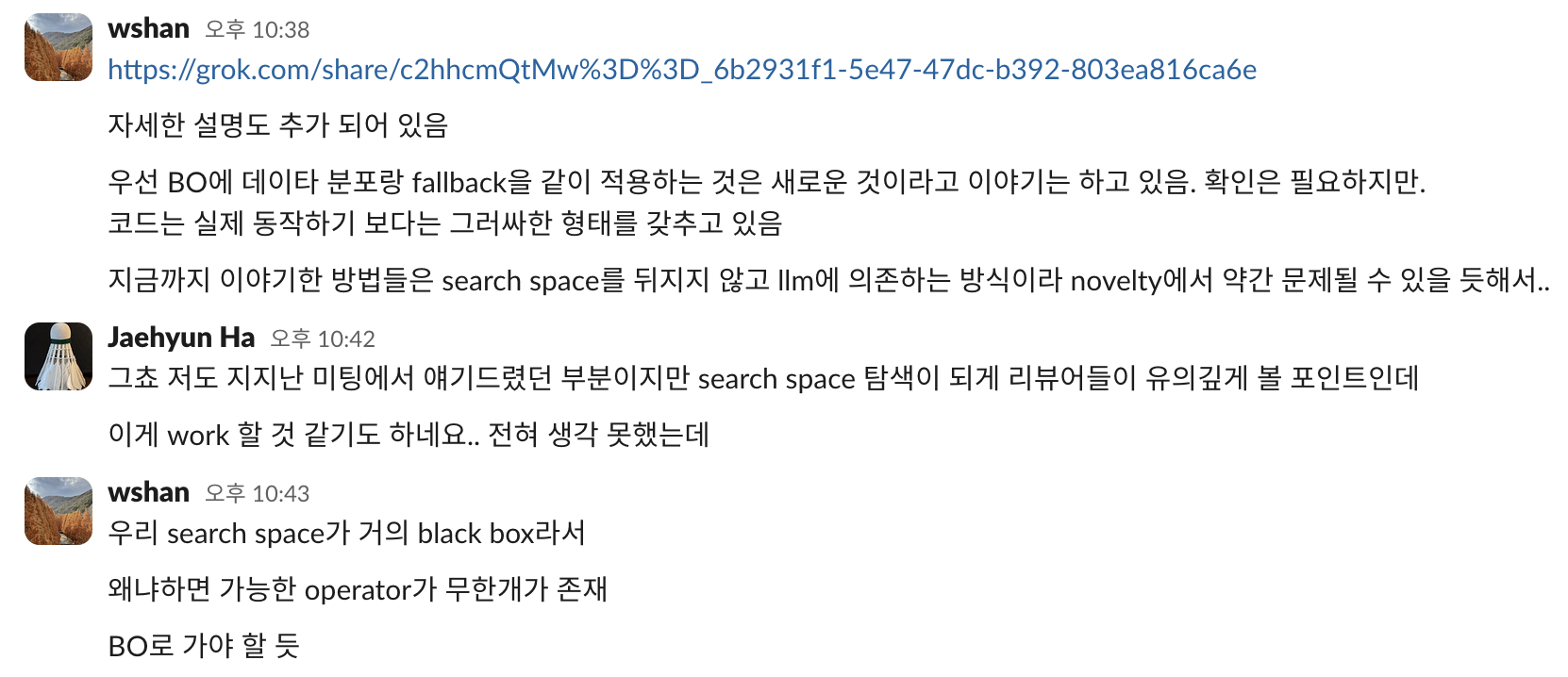
그때 교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베이지안 최적화’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AI에게 물어 대뜸 공유해주셨다. 훌륭하게 작동하는 아이디어였다.
왜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나는 못했을까? 그분은 내 아이디어가 가진 한계를 의심하고 더 나은 해답을 찾아냈지만,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며 사고를 멈췄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이 돌아오는 것은 사람이나 AI나 마찬가지다. 전문가의 수준 차이가 AI 활용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리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라
“AI가 더 발전하면 질문과 검증도 스스로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AI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고 극복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건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지능’이다. 그 시대의 생존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고품질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그 정도의 AI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논문들조차 논리가 이상한 것들이 수두룩한데, AI가 학습할 초고품질의 논리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기에 현재 우리의 생존 전략은 명확하다. 교수든 연구원이든 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전문가조차 질문을 던지기 어려운 문제, 지금의 인간에게도 극도로 어려운 문제. 수천만 라인의 코드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거대하고, 남들이 피하는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쉬운 문제는 모두 AI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살아남는 길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는 것, 그뿐이다.